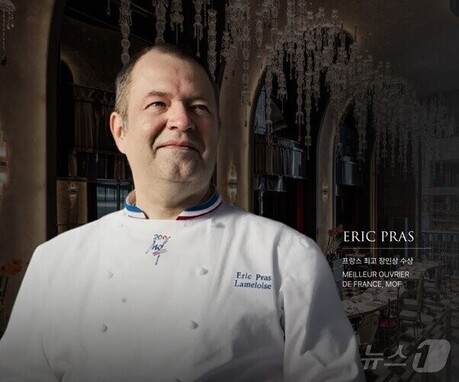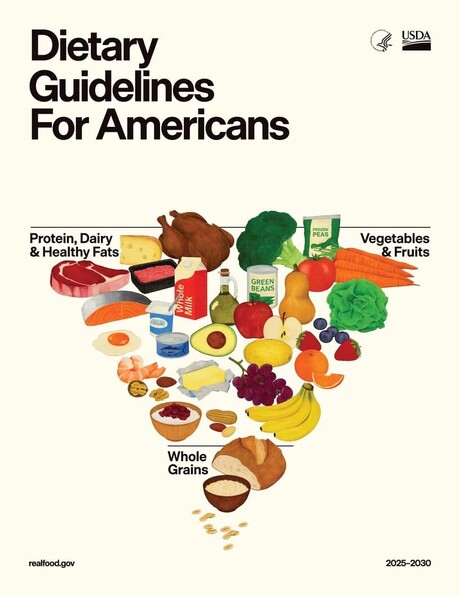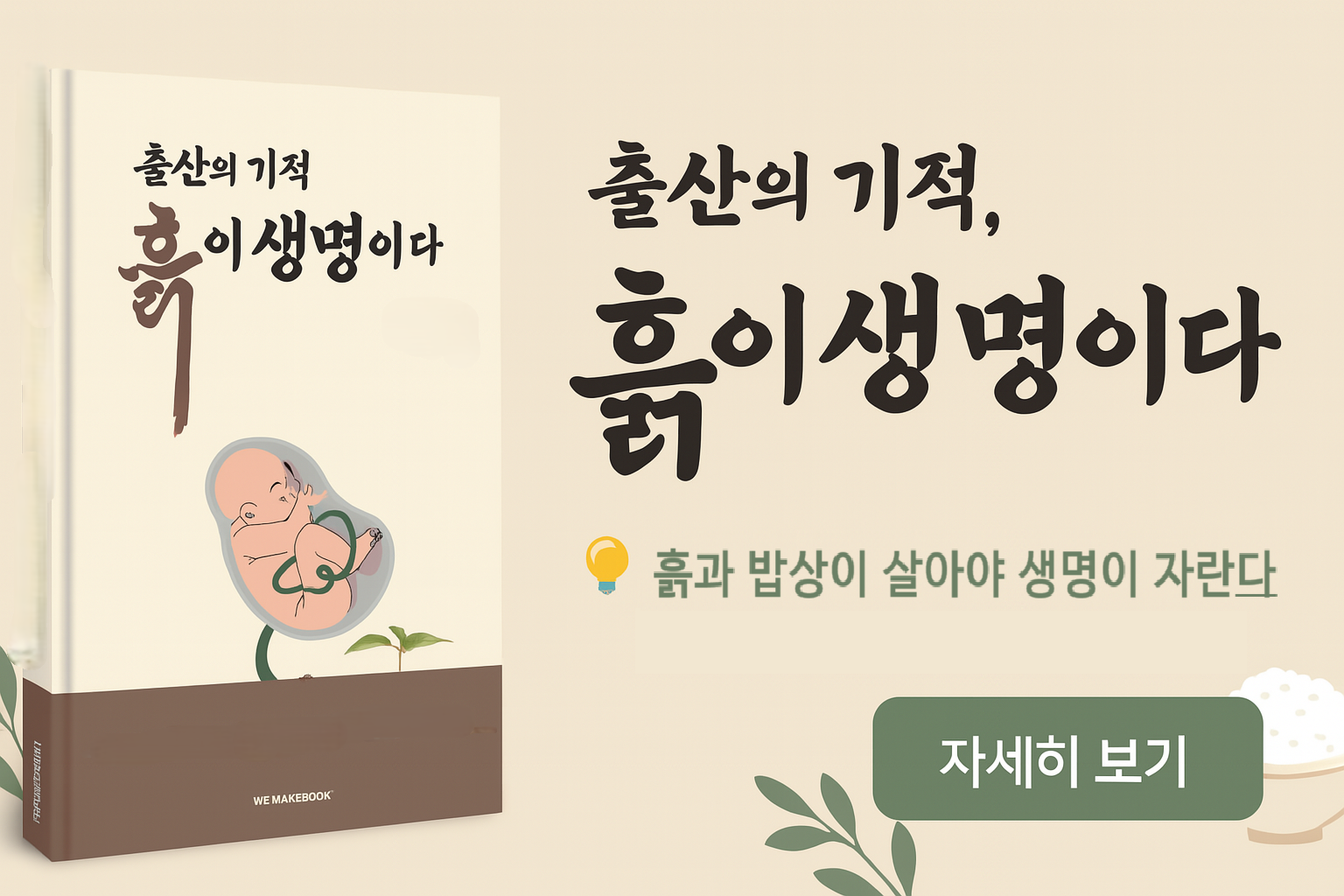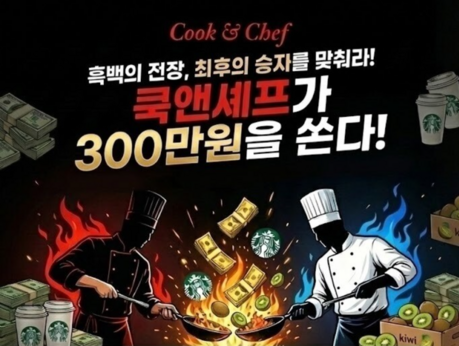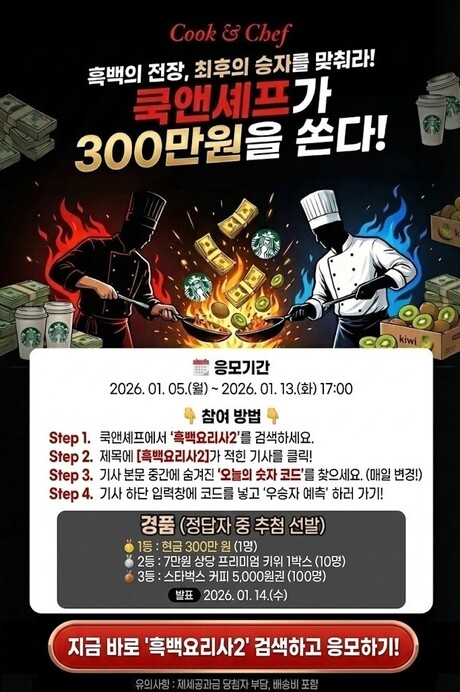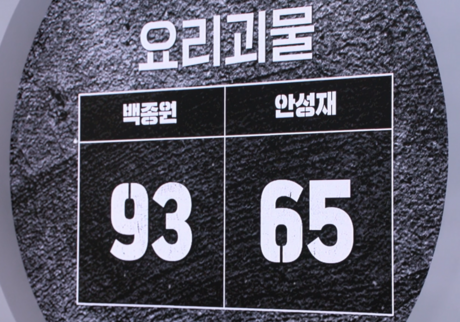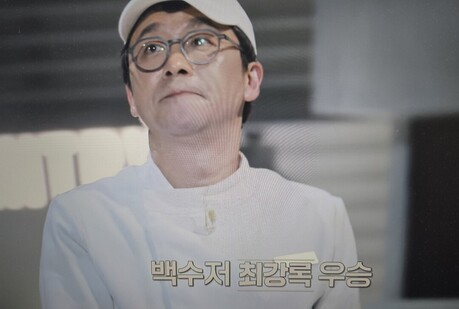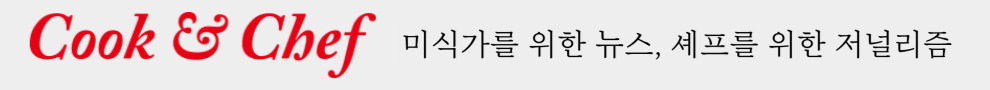[Cook&Chef = 민혜경 기자] 울릉도의 바람과 비, 땅과 바다 속에서 자라난 오래된 맛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울릉군은 7월 2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슬로푸드한국지부와 함께 ‘맛의 방주(Ark of Taste)’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대황·두메부추·부지갱이·오징어누런창 흰창찌개 등 4종의 울릉도 고유 식재료가 국제슬로푸드협회의 등재 목록에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울릉군이 2013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지역 식재료 보존운동의 성과이자, 슬로푸드운동의 철학이 지역 안에서 뿌리내린 결과다. 이날 수여식에는 남한권 울릉군수와 이상식 군의회의장, 남진복 도의원, 지역 슬로푸드회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사라져가는 맛을 구하는 국제 프로젝트
‘맛의 방주’는 1996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국제 슬로푸드운동의 핵심 프로젝트다. 산업화와 세계화, 기후위기, 유전자조작 농업의 확산 등으로 인해 점차 사라지는 전통 식재료와 조리법을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현재까지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700여 종 이상이 등재돼 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음식 보존을 넘어, 한 지역의 기억과 공동체, 환경과 노동의 역사까지 함께 담고자 한다.
등재 기준은 까다롭다. 우선 맛이 뛰어나야 하고, 해당 식재료가 지역성과 긴 역사적 맥락 속에 존재해왔으며, 현재 또는 미래에 소멸 위기에 처해 있어야 한다. 또한 GM(유전자조작) 식품은 등록할 수 없고, 소규모 생산과 공동체 기반 생산 방식을 전제로 한다. 2025년 2월 기준, 한국에서는 총 123개 품목이 맛의 방주에 등재돼 있으며, 울릉군의 이번 4개 품목 추가로 그 기여가 더욱 두드러지게 됐다.

울릉에서 지켜낸 네 가지 식재료
이번에 등재된 식재료는 모두 울릉도의 고유한 자연과 식문화에서 비롯됐다. ‘대황’은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약용 식물로, 신맛과 청량한 향이 특징이다. ‘두메부추’는 야생 부추의 일종으로 일반 부추보다 향이 강하고 식감이 단단해 무침이나 장아찌에 적합하다. ‘부지갱이’는 울릉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나물로, 강한 풋내와 쌉싸래한 풍미가 살아있는 식재료다. 그리고 ‘오징어누런창 흰창찌개’는 울릉도 어민들의 오랜 가정식으로, 오징어 내장을 활용해 깊고 구수한 맛을 내는 대표 향토 음식이다.
울릉군은 이들 식재료가 대량 생산이 어렵고 유통망에 오르기 힘들지만, 바로 그 한계가 오히려 고유성과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맛의 방주 등재는 지역 음식이 단지 먹는 것을 넘어서 문화로, 브랜드로, 산업으로 이어지는 시작점”이라고 설명했다.
울릉군 슬로푸드운동 12년의 성과
울릉군의 맛의 방주 등재 노력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2013년 섬말나리와 칡소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울릉홍감자와 손꽁치, 2015년에는 울릉긴잎돌김, 2020년에는 물엉겅퀴, 2023년에는 명이까지 해마다 등재 품목을 늘려왔으며, 이번 4종 포함 총 12개 품목이 울릉의 이름으로 세계 식문화 보호 리스트에 올라갔다.
이날 함께 진행된 회원 역량강화 교육에서는 김종덕 슬로푸드한국지부 회장이 직접 “슬로푸드 운동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했고, 장현례 슬로푸드협회 강사가 ‘울릉군이 앞으로 지켜야 할 방향성’을 중심으로 지역운동의 다음 단계를 제시했다.
박정애 울릉군지부장은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군민들과 함께 이뤄졌다”며, “지금의 성과는 땅을 아끼고, 제철을 존중하며 살아온 울릉 사람들의 삶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소회를 밝혔다.
조리의 시작은 재료, 요리의 미래는 기억이다
울릉군의 맛의 방주 등재는 단지 식재료 보호를 넘어서, 외식과 조리 문화 전체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요리는 식재료를 어떻게 다루는가의 기술이지만, 어떤 재료를 왜 지키는가의 태도이기도 하다.
산업화된 조리 환경 속에서 사라지는 로컬의 맛과 감각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조리업계와 셰프, 생산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기후위기로 지역 고유종이 빠르게 사라지는 시대에, 울릉도가 지켜낸 맛이 세계적인 문화 자산이 되어가는 모습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브랜드화 가능한 품목을 발굴해 울릉 음식의 정체성을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지난 세대가 남긴 손맛과 땀방울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 맛을 내일의 밥상에 그대로 남기기 위한 약속이 바로 ‘맛의 방주’다. 맛은 기록될 수 없지만, 기억될 수는 있다. 울릉에서 시작된 이 소박한 실천이, 지역과 세대, 그리고 미래를 잇는 조리의 언어로 이어지길 바란다.
[저작권자ⓒ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