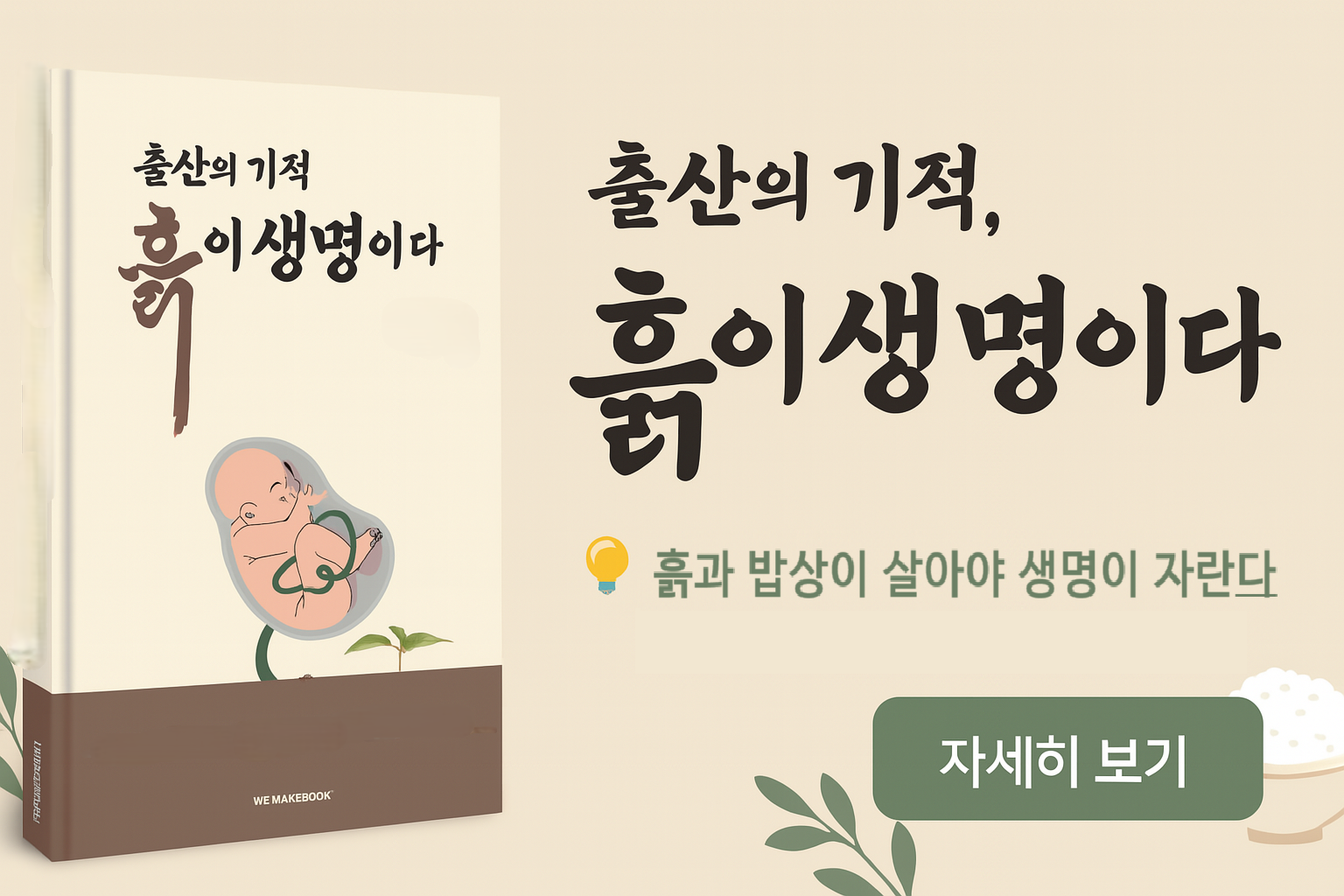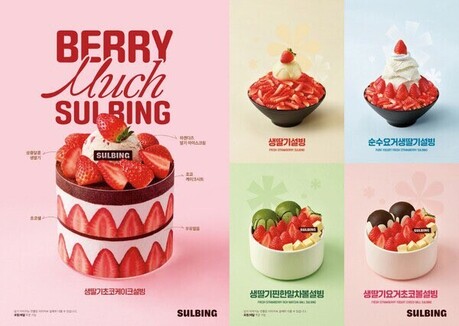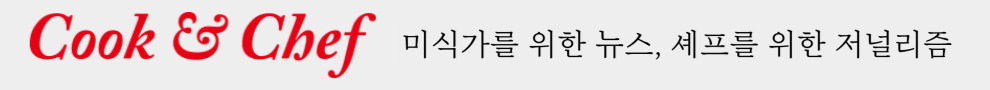[Cook&Chef = 이경엽 기자]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농식품바우처가 ‘낙인 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은 카드 뒷면에 ‘농식품바우처’가 표기돼 결제 순간 취약계층 신원이 노출된다며, 디자인을 비식별 방식으로 전환하고 제도를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업 외연은 빠르게 확대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사용처는 2024년 2,260개소에서 현재 6만 660개소로 26.8배 늘었고, 2020년 시범 도입 이후 올해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예산도 2022년 81억6,500만 원(4.7만 가구), 2023년 138억4,600만 원(6.6만 가구), 2024년 138억2,800만 원(9.6만 가구)에서 올해 320억8,700만 원으로 확대됐다(운영비 제외 지원금 기준).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용 편의와 프라이버시, 지원대상·지원수준의 정합성은 여전히 도마 위에 올랐다.
지원대상 설정의 협소함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 제도는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 가구로 한정돼 청년 등 취약군이 배제된다. 가구 단위 지급 구조 역시 역진성이 뚜렷하다. 1인가구 4만 원, 2인가구 6만5,000원, 3인가구 8만3,000원, 4인가구 10만 원으로, 가구원이 늘수록 1인당 지원액이 줄어든다. 고물가 상황에서 장바구니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현장 평가가 뒤따른다.
윤 의원은 “농식품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밥상을 지키는 중요 제도”라며, 카드 표기 개선을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금 현실화를 주문했다. 동시에 국산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식·외식 공급망 관점에서 보면, 낙인 방지와 함께 ‘쓰기 쉬운 제도’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결제 환경에서는 일반 체크·선불카드와 구분되지 않는 비식별 디자인이 필요하고, POS 단에서 허용 품목 자동 필터링·원산지 연동이 구현되면 현장 혼선을 줄일 수 있다.
대상 설계는 청년·1인가구 등 영양 취약군을 포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가구원수와 무관하게 1인당 최소 보장액을 설정해 역진 구조를 보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농산물 선택권을 넓히되, 품목 쏠림과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권역 단위 분산·조달 장치가 병행돼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번 문제 제기는 예산과 사용처 확대라는 외형 성장에 걸맞은 ‘체감 품질’의 제고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카드 디자인, 합리적 대상·금액 체계, 결제·조달 인프라의 정비가 맞물릴 때, 농식품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식탁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다.
[저작권자ⓒ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