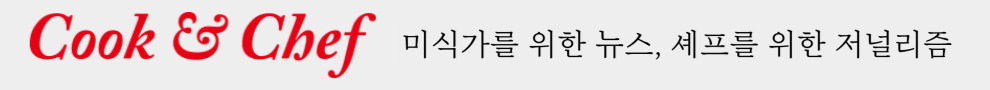[Cook&Chef = 이경엽 기자]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2023년에 이어 세 번째 죽음이다. 빵을 만들던 사람이 빵을 만드는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새벽 세 시, 냉각 컨베이어에 몸이 끼여 상반신이 찢겼다. 윤활유를 뿌리기 위해 기계 안에 들어갔다가 생긴 일이다.
절삭유일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공업용 윤활유가 사용되었는가? 경찰과 노동부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는 사고 발생 29일 만에 시작됐다. 법원이 세 번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늦은 것은 수사가 아니라, 우리의 감각이다.
SPC는 "빵은 안전하다"고 말한다. “식품용 윤활유를 쓴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말한다. “맛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정말 그 빵은 예전과 같은 맛일까?
▍맛은 혀로 느끼는가, 마음으로 느끼는가
심리학자 폴 로진(Paul Rozin)은 음식의 맛을 ‘감각적 경험’이자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정의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단지 혀로 음식을 평가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의미로 음식을 접하는지가 맛의 인지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그의 연구 중 유명한 실험이 있다.
동일한 초콜릿을 피험자들에게 제공하되, ‘연인의 선물’로 포장했을 때와 ‘산업 폐기물 곁에서 발견된 것’처럼 제시했을 때의 평가를 비교했다. 맛은 같았지만, 평가는 극명히 달랐다. 전자는 “깊고 진한 풍미”, 후자는 “입에 넣기 꺼려지는 맛”으로 평가됐다.
다시 말해, 음식은 미각 이전에 사회적 신호다. 그 신호가 불쾌하거나, 불안하거나, 불쾌한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맛을 느끼지 못한다. 혹은, 의도적으로 거부하게 된다.
▍SPC 빵, 소비자는 알고 있다
SPC 그룹의 빵은 국내 제빵 시장 점유율 1위다. 고급스러운 포장, 정제된 이미지, 깨끗한 매장. 하지만 브랜드 이미지는 노동자의 죽음이라는 사실 앞에 무너졌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빵. “빵이 사람을 죽였다”는 소비자의 분노는 단순한 도덕적 비난이 아니다. 그것은 감각의 붕괴에 대한 저항이다.
“나는 더 이상 그 빵을 먹을 수 없다.”
이 말은 ‘불매’의 선언이자, 미각의 저항이다. 소비자의 뇌는 이미 그 빵의 맛을 바꿔버렸다. 씁쓸하고, 껄끄럽고, 목이 메인다. 그것은 심리적 현상이며, 동시에 사회적 윤리가 촉발한 감각의 변화다.
▍브리아-사바랭이 말한 '먹는다는 것'
프랑스 미식 철학자 브리아-사바랭(Jean Anthelme Brillat-Savarin)은 『미각의 생리학』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를 말해달라.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그의 이 말은 단순히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어떤 식품을 선택함으로써, 어떤 세계관을 선택하는지를 보여준다는 뜻이다.
SPC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는가’뿐 아니라 ‘누구의 손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대가로 만들어졌는가’를 묻게 한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소비자는 더 이상 무감각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먹으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사먹으면서 분노한다. 브리아-사바랭의 격언은 이렇게 바뀐다.
“당신이 누구에게서 사먹느냐가 당신의 윤리다.”
▍기자가 찾아야 할 맛의 연결고리
지난달 21일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나는 고민했다. “사람이 죽은 사건과 음식의 맛은 무슨 상관이냐”는 회의적인 질문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 질문이다.
진짜 질문은 이렇다.
“왜 우리는 윤리적이지 않은 기업의 음식을 불편하게 여기는가?”
“왜 사람을 죽인 회사의 빵은 더 이상 맛있지 않은가?”
이 질문은 기자의 주관이 아니라, 심리학과 철학, 사회학이 탐구해온 오래된 주제다. 음식은 생존의 수단이지만, 동시에 정체성의 표현이며, 공동체의 윤리를 담는 상징이다. 그리고 지금 SPC의 빵은 그 윤리를 배반하고 있다.
▍우리는 혀로 먹지만, 마음으로 느낀다
SPC의 빵이 정말 맛이 없어진 걸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걸까? 정답은 없다. 그러나 맛은 단지 혀의 작용이 아니라 뇌의 해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심리학자 찰스 스펜스(Charles Spence)는 “음식의 맛은 그 재료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감각의 통합”이라고 말했다.
공장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한 빵은 우리 머릿속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분류되기 어렵다. 그 빵은 죄책감의 맛이고, 회피의 맛이고, 결국 씁쓸함이다.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먹을 것인가”만을 묻지 않는다.
“누구로부터 사먹을 것인가”, “어떤 노동의 결과물을 소비할 것인가”를 묻는 시대에 들어섰다. 그리고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지 못하는 식품기업은, 그 어떤 화려한 포장으로도 맛을 감출 수 없다.
진정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음식이 태어난 시스템이 윤리적이어야 한다.
[저작권자ⓒ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