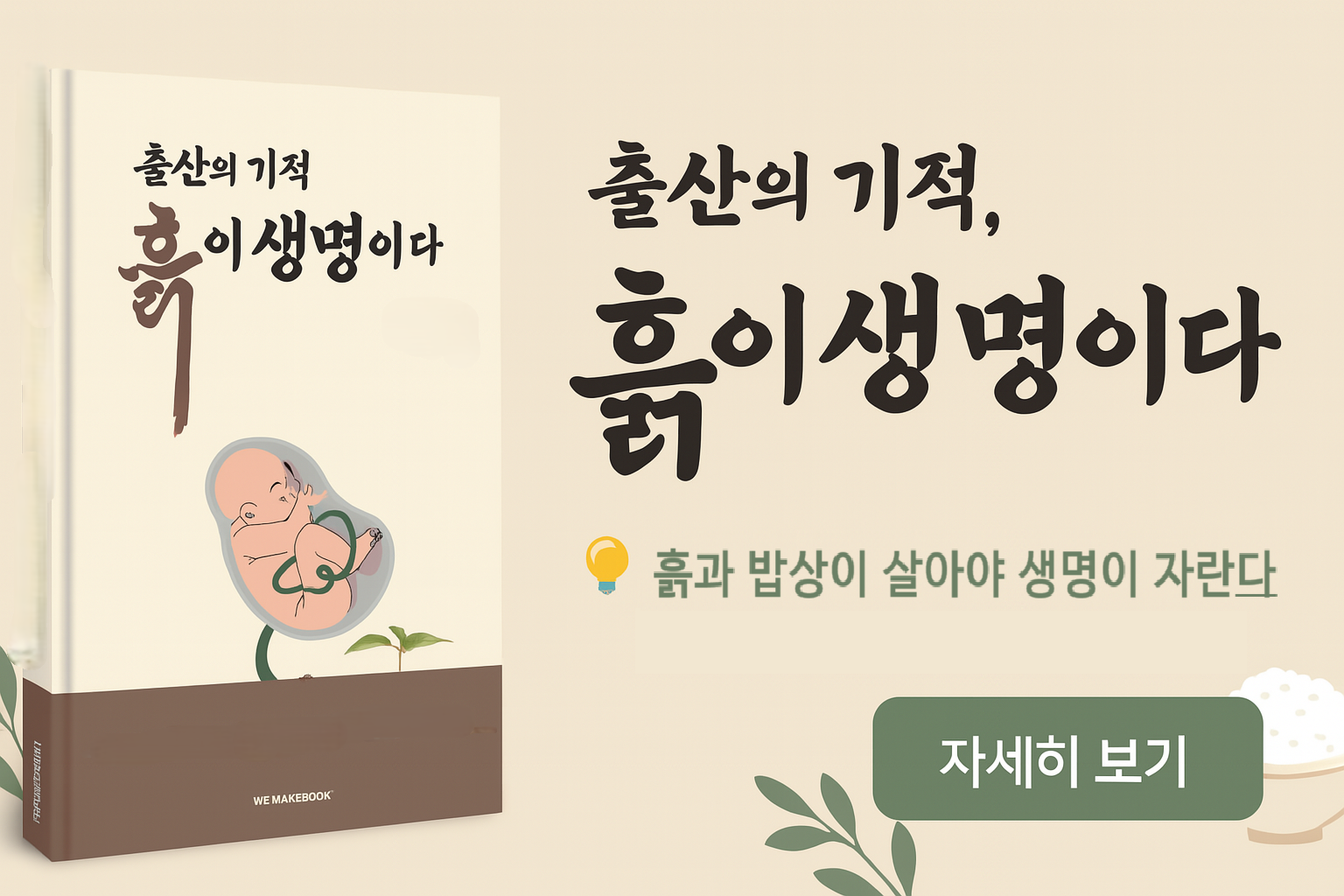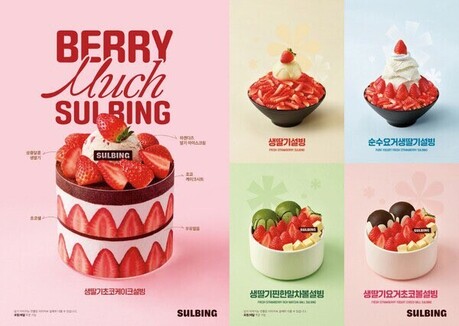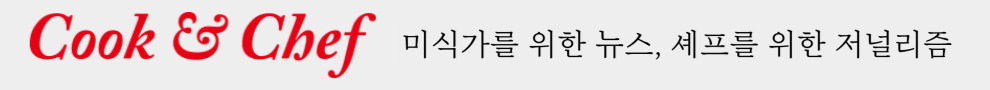[Cook&Chef = 이경엽 기자] “이 술은 ○○에서 왔습니다.”
지역 이름을 달고 시장에 나오는 전통주, 그 품격과 진정성은 어디서 올까? 결국 ‘지역 농산물’이라는 주원료의 뿌리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전통주의 ‘지역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발의한 「지역특산주 농산물 수급 확대법」이 주목받고 있다. 이 법은 기존보다 더 넓은 범위의 인접 지역을 허용해 원료 수급의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제도 개선안이다.
지역특산주, 정체성과 공급망 사이에서 길을 묻다
현행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지역특산주’를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및 그 인접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제조한 술”로 정의하고 있다. 이 기준은 전통주의 지역성과 차별성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문제는 ‘인접 지역’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 해 장마가 길어져 자두 수확량이 줄거나, 이상 고온으로 쌀 품질이 나빠지면 당장 원료 수급이 어려워지고, 지역특산주의 생산이 멈추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윤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인접 지역’의 범위를 제조장이 위치한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모든 시·군·구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역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통주, 술을 넘어선 지역 농업의 확장판
윤준병 의원은 “전통주는 단지 술이 아니라 지역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전통주 시장은 2021년 941억 원에서 2024년 1,475억 원으로 급성장 중이며, 지역 농특산물 소비를 견인하는 플랫폼 역할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원료 수급의 유연성 부족은 이 성장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지역 농산물만을 고집하다가 원료가 부족하면 생산을 멈추거나, 억지로 타 지역 농산물을 써야 하는 모순적 상황도 빈번했다. 이 개정안은 정체성과 유연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투명한 지역성’이 더 중요
요즘 전통주 소비자들은 단순히 ‘맛’보다는 ‘이 술이 어디서 왔는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가’를 중시한다. 이런 흐름에서 ‘지역 농산물’을 강조하는 마케팅은 강력한 무기가 되지만, 동시에 지켜야 할 약속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원료 수급이 어려워졌을 때, 법적으로 명확한 허용 범위 안에서 인접 지역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는 오히려 소비자 신뢰를 지키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바로 그 투명한 신뢰 기반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읽힌다.
‘조리’는 원료에서 시작된다
전통주 역시 ‘조리’다. 술 빚기의 첫 단계는 ‘좋은 재료’ 확보에서 출발한다. 지역 특산주를 빚는 장인들은 한 해의 농사를 기다리고, 지역 농산물의 특성을 반영해 술의 맛과 향을 설계한다.
하지만 날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예측 불가능한 재해 속에서도 술을 빚고, 그 맛을 소비자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에서의 안정성과 유연성 확보가 필수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전통주 산업을 농업과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 바라보고,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조리법과도 같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저작권자ⓒ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