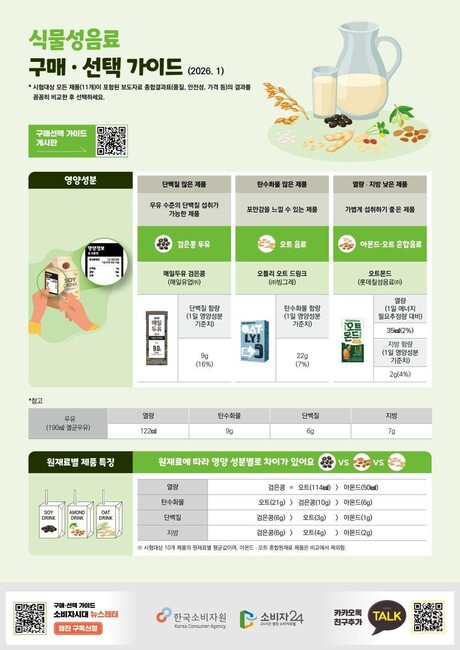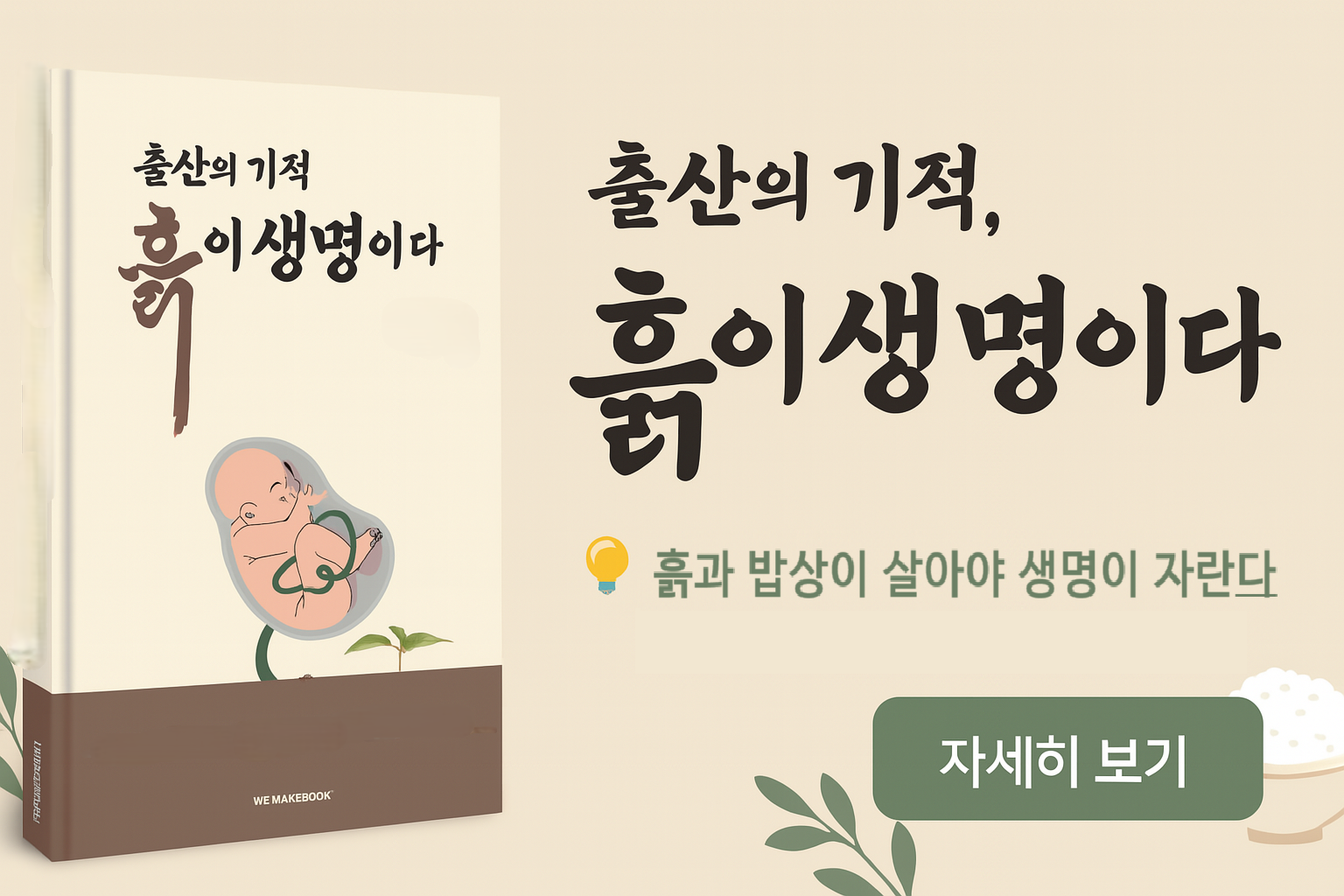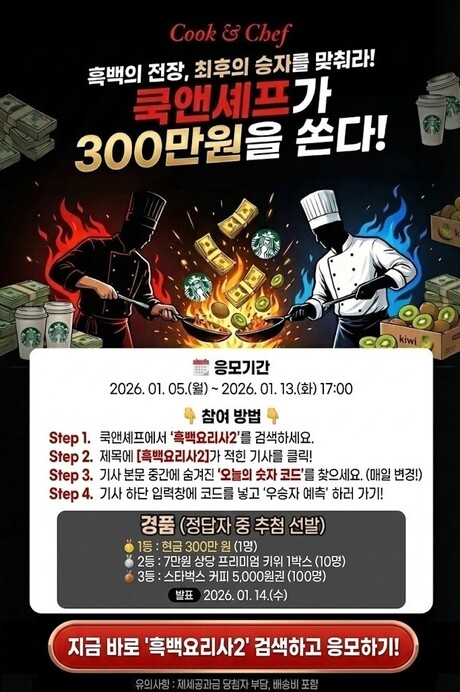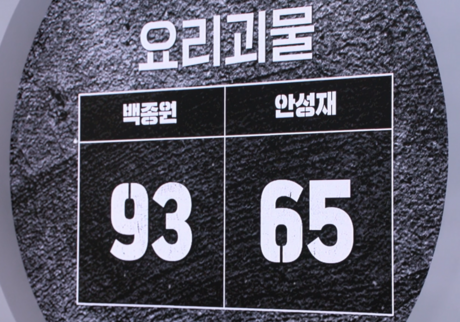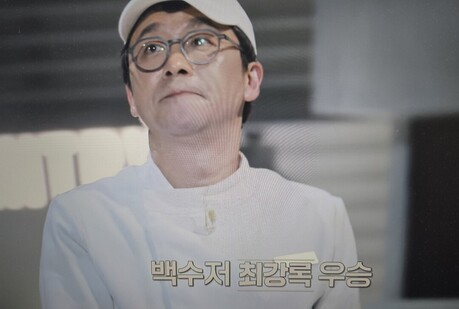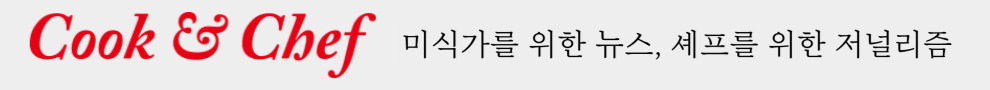[Cook&Chef = 이경엽 기자]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다.
셰프의 손끝에서 식재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결정적인 재료’이자, 한 그릇의 깊이를 좌우하는 기초이면서 궁극적인 맛의 도구다. 이 원칙을 알고 있는 셰프들이 최근 주목하고 있는 소금이 있다. 바로 태안 자염(煮鹽)이다.
태안 자염은 말 그대로 ‘끓여서 만든 소금’이다. 일반 천일염처럼 바닷물을 증발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마른 갯벌에 해수를 투과시켜 농축한 뒤 10시간 넘게 불에 올려 끓여내는 전통 제조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고된 손작업과 장시간의 열, 그리고 갯벌이라는 유기적인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비로소 ‘자염’이 완성된다.
“소금 하나로 음식의 무게 중심이 달라진다”
태안군 근흥면 마금리에 위치한 한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01년, 50여 년 전 사라졌던 자염 생산을 복원하는 데 성공하며 자염 생산의 맥을 이었다. 참고할 만한 문헌이 거의 없었던 만큼, 지역 노인의 기억과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태안만의 전통 방식인 ‘통자락 방식’을 되살린 것이다.
이 자염은 미슐랭 셰프들과 고급 레스토랑, 발효 장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알려지며 고급 식재료로 자리매김했다. 이유는 명확하다. 입자가 고르고 미세하며, 쓴맛이나 떫은맛이 전혀 없고 감칠맛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자염에는 칼슘 함량이 천일염보다 높고, 유리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김치 발효, 젓갈 숙성, 육류 마무리 간에 이르기까지 미묘한 맛의 조율에 탁월한 효과를 준다.
태안 자염은 2013년 슬로푸드국제대회에서 ‘맛의 방주(Ark of Taste)’에 등재되며, 세계적으로도 보전 가치가 높은 전통 식재료로 인정받았다. 이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식문화 유산 중 보존하고 전승해야 할 식재료에 부여되는 국제적 인증이다.
“한 숟갈 속에 담긴 문화, 기억, 그리고 땅의 시간”
자염은 단지 맛의 문제를 넘어 한식의 뿌리를 되살리는 작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서해안 갯벌을 기반으로 생산돼 왔으나, 20세기 초 천일염의 대량 생산과 땔감 부족으로 1960년대 전면 단절된 전통 기술이었다. 갯벌, 써레, 불, 수증기라는 일련의 복잡한 요소를 모두 복원해야 했기에 문화재 복원에 가까운 과정이기도 했다.
현재 자염을 생산하는 마금리 낭금갯벌은 소조기에는 무려 7~8일간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국내 유일의 ‘무제염전 환경’이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간척사업의 물결 속에서도 우연히 살아남은, 갯벌 문화의 마지막 성지와도 같다. 1960년대 제방 유실 사고로 인해 간척이 실패로 돌아간 이 지역이 결과적으로 한국의 전통 소금 문화의 유일한 복원 가능지로 남았다는 점은 역설적이지만 상징적이다.
조리와 문화 사이, 셰프가 먼저 알아본 전통
고된 불작업을 견뎌야 하고 생산량은 연 20~30톤 수준에 불과하지만, 셰프들은 이 소금을 찾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맛이 다르기 때문이다.
고기 육즙을 날리지 않고 잡내를 막는 데, 국물에 쓴맛 없이 깊이를 더하는 데, 혹은 생선 염지나 발효 장 담그기의 민감한 밸런스를 잡는 데 자염만큼 정확한 소금은 드물다는 평가다.
태안 자염은 단순한 향토 식재료가 아니다.
한식의 원형을 회복하고, 전통 조리방식의 가치에 집중하는 셰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 식재료’이자, 문화유산이자, 조리철학의 출발점이다.
[저작권자ⓒ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