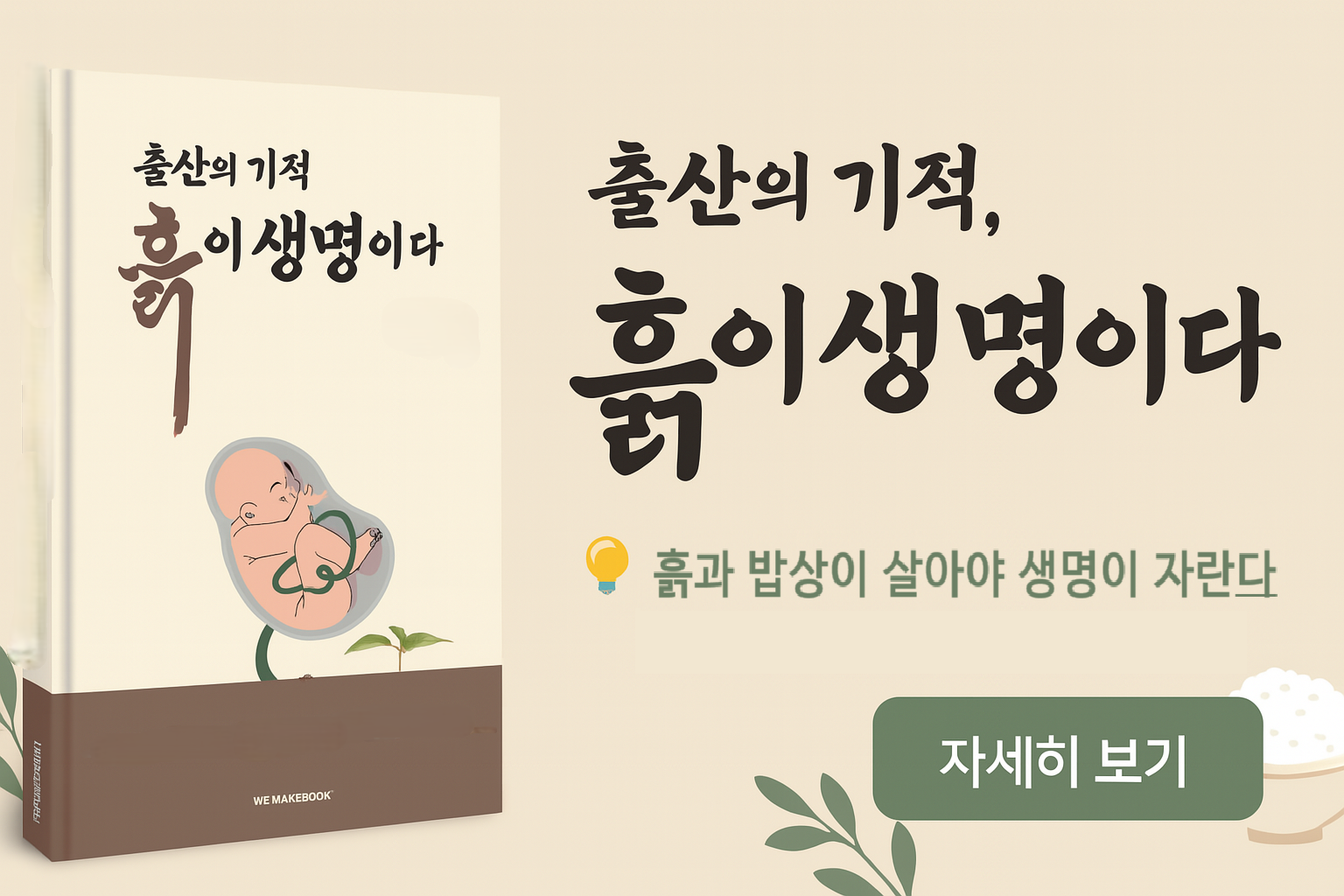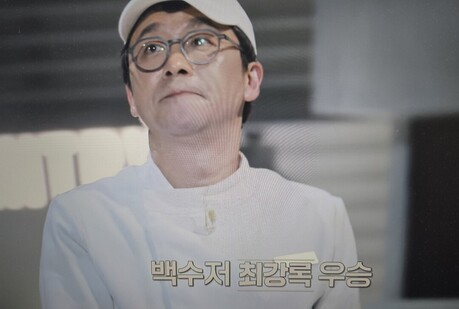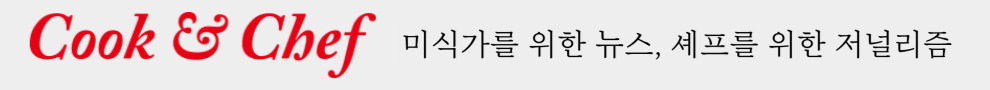찬 바람 불면 굴에 살이 오르고 단맛이 깊어진다. 바위에 붙어살아 석화(石花)라고도 부르고 모려(牡蠣), 이황(蜊蝗), 려(蠣), 호(蠔) 등으로도 칭한다. 20세기 전까지 한반도 남쪽에서는 석화라는 단어를, 북쪽에서는 모려를 주로 사용했다.조선 세종·문종·세조에 걸쳐 어의(御醫)로 활약한 전순의(全循義)는 왕실의 음식 치료법을 모은 식료찬요(食療纂要·1460)에서 '술을 먹고 난 후의 번열(煩熱·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나는 증상)을 치료하고 갈증을 그치게 하려면 굴(牡蠣肉)에 생강과 식초를 넣어 날로 먹는다'고 적었다
SEASON's FOOD
겨울바다 영양 보고(寶庫)
굴

굴은 한반도 전역에서 고르게 생산됐다. 1908년 일본인들이 쓴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는 근대식 양식 이전 조선의 굴 산지로 '함경도 황어포·영흥만, 낙동강 하구 동쪽 일대, 광양만, 순천만(여자만), 보성강, 강진만, 충청도 천수만, 황해도 용위도 등'을 들고 있다. 일제강점기 신문에는 '원산 모려'와 수원의 '남양석화'가 유명하다고 자주 나온다.굴은 조선 시대부터 회·구이·밥·죽·김칫소 등 다양하게 사용됐다. 이익은 성호전집(星湖全集)에 굴을 '순무에 잘게 섞어 김치를 만들어서' 술안주로 먹었다고 썼다.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1766)에는 굴을 넣은 박죽(瓠粥)·석화죽, 연포탕, 굴밥이 등장한다. 진상품으로 올릴 만큼 귀했던 굴은 1887년 전남 고흥에서 양식이 시작되고, 1960년대 통영에서 양식이 본격화되면서 서민적인 식재료가 되었다.

조리법도 다양해져서 이용기(李用基)가 1924년 지은 한식 요리책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는 굴밥, 굴김치, 굴장아찌, 굴전유어, 굴회가 등장한다. 고흥에서는 굴을 껍데기째 끓여 뽀얗게 국물을 우려낸 '피굴'을 즐겨 먹고, 통영에선 무와 굴을 무쳐 발효한 '굴무젓'을 먹는다.
[저작권자ⓒ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