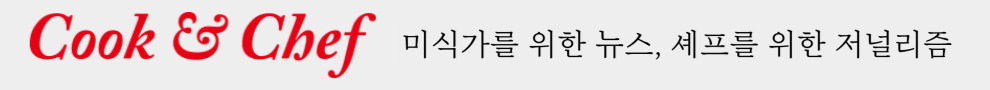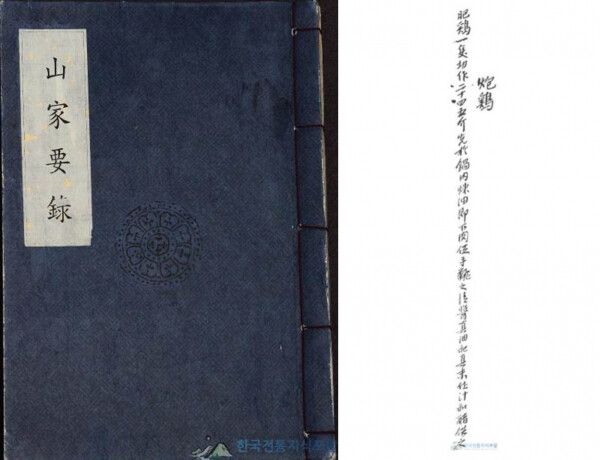
[Cook&Chef = 서현민 기자] 조선 시대 중기의 조리서 산가요록에는 ‘포계(炮鷄)’라는 닭요리가 등장한다. 포계는 한자로 ‘포(炮·불과 기름로 익힌다)’와 ‘계(鷄·닭)’를 뜻한다. 이름만으로도 단순히 삶거나 찌는 조리법이 아니라, 기름을 열매체로 활용해 닭을 익혔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록은 오늘날의 통닭과 직접적으로 동일한 음식은 아니지만, 닭을 기름으로 조리했다는 점에서 통닭의 원형을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산가요록은 조선 세종·문종 시기에 편찬된 농·생산·식생활 종합서로, 현재까지 전해지는 한국의 가장 오래된 조리서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음식 조리법뿐 아니라 재료의 보관, 약선, 저장식, 생활 지혜까지 포괄한다. 이 책에 포계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당시 이미 닭을 기름으로 익히는 조리법이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의미한다. 단순한 가정식이 아니라, 연회와 상차림에도 사용될 수 있는 격식을 갖춘 요리였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포계의 조리법은 간결하지만 핵심이 명확하다. 닭 한 마리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솥에 기름을 두른 뒤 조각낸 닭을 넣어 익힌다. 충분히 익으면 간장, 식초, 참기름을 더해 맛을 마무리한다. 기록과 해석을 종합하면, 여기서의 기름은 오늘날처럼 대량의 식물성 식용유라기보다 돼지기름이나 소기름 같은 동물성 지방이 중심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조선 시대에는 기름을 대량으로 정제하고 유통하는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기름은 귀한 조리 자원이었고, 기름 조리는 특별한 경우에 사용되는 기술이었다.
이 때문에 포계는 현대적인 의미의 튀김과는 차이가 있다. 오늘날의 프라이드치킨은 밀가루나 전분으로 외피를 만들고, 170~190도의 고온에서 한꺼번에 튀겨 바삭한 식감을 강조한다. 반면 포계는 기름을 열매체로 삼되, 밀가루 반죽을 사용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낮거나 중간 온도에서 서서히 지져 익히는 방식에 가까웠다. 고온 튀김보다 볶음과 지짐 사이에 놓이는 조리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양념 구성은 포계의 미각적 성격을 잘 보여 준다. 간장은 염미와 감칠맛을 부여하고, 참기름은 향을 더하며, 식초는 기름에서 오는 묵직함을 정리한다. 특히 식초의 존재는 의미가 크다. 기름진 음식에서 산미가 뒷맛을 정리하고 소화를 돕는다는 인식이 이미 조선 시대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오늘날 치킨과 함께 등장하는 무절임, 레몬, 피클과 같은 곁들이는 역할을 포계의 식초가 이미 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포계는 궁중과 연회 상차림에서도 활용되었다. 쇠고기나 꿩을 말린 포류가 진한 풍미를 맡았다면, 포계는 비교적 담백하면서도 향이 살아 있는 고기 요리로 상차림의 균형을 담당했다. 저장성, 운반성, 접대용 상차림이라는 여러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켰다는 점에서, 단순한 한 가지 요리라기보다 조리 문화 전체의 한 축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포계를 통닭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닭을 기름으로 익힌다는 발상, 기름진 맛을 산미와 향으로 정리하는 조리 감각, 상차림 속에서 역할을 분담시키는 구조는 오늘날의 닭요리까지 이어지는 사고방식과 닿아 있다. 포계는 치킨의 직접적인 시초라기보다, 닭과 기름을 다루는 조선 시대 조리 철학을 보여 주는 실마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포계는 한 시대의 기록을 넘어, 우리 식탁의 역사를 돌아보게 하는 음식이다. 기름이 귀하던 시절에 닭을 기름으로 익히며 맛과 균형을 고민했던 흔적은, 지금 우리가 자연스럽게 즐기는 치킨 문화의 뿌리에 또 하나의 층위를 더한다. 조선의 포계는 전통과 현재가 맞닿는 지점에서, 닭요리가 가진 시간의 깊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사적 증거로 남아 있다.Cook&Chef / 서현민 기자 cnc02@hnf.or.kr
[저작권자ⓒ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