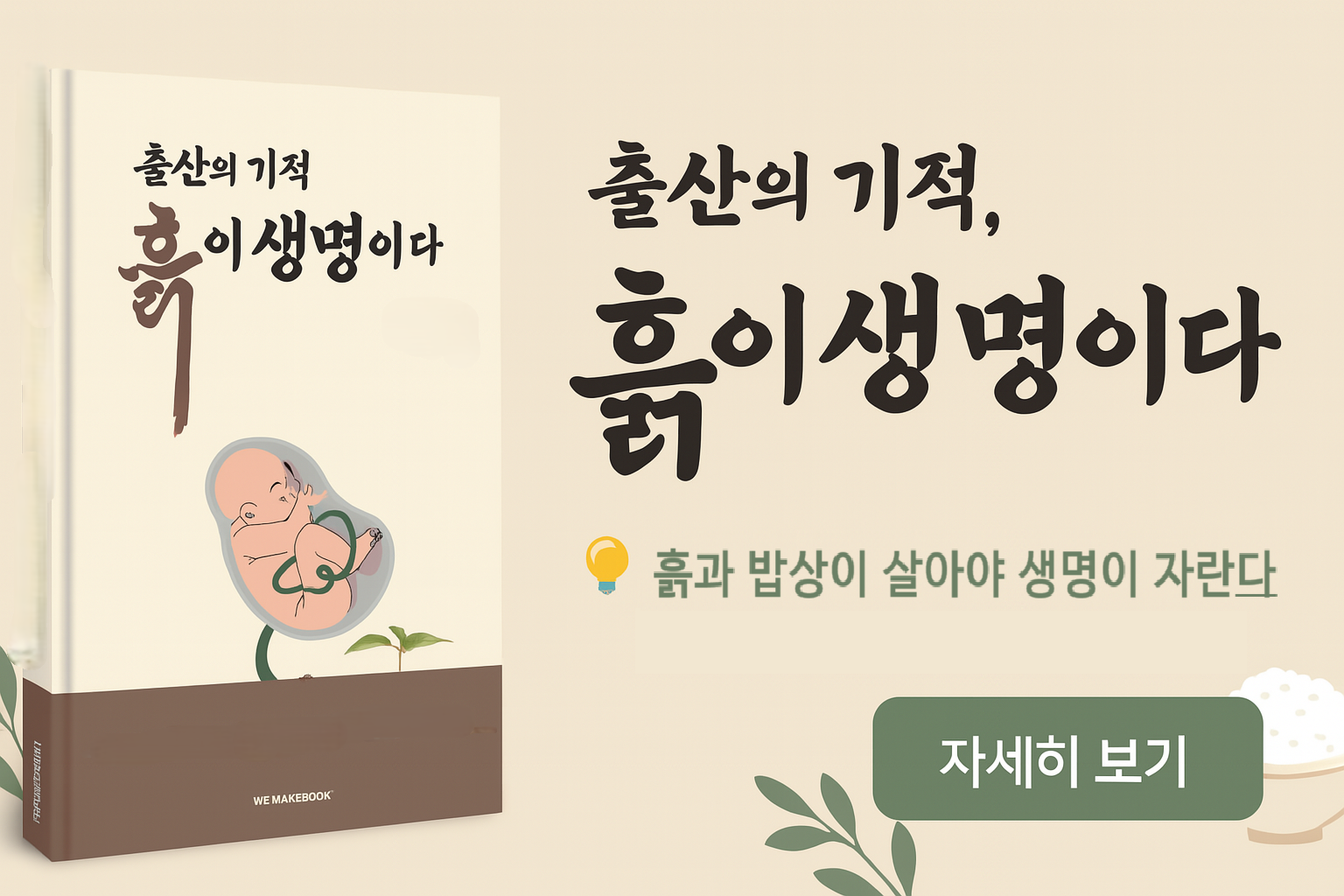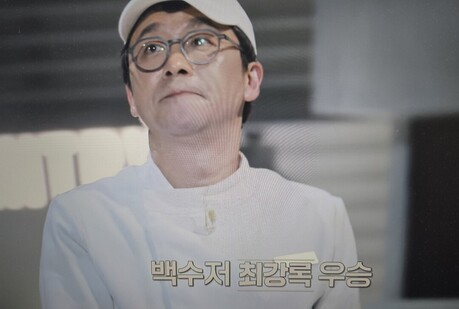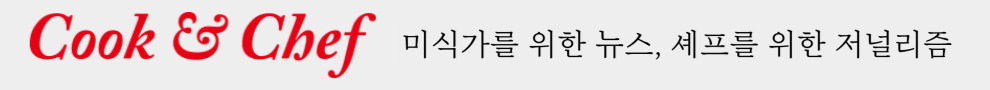날이 추워지면서 오동통한 면발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근한 국수 한 그릇이 생각난다. 국수의 주성분인 탄수화물에는 세로토닌이 많이 함유돼 뇌의 진정효과는 물론 스트레스를 풀어준다고 한다. 이뿐인가. 후루룩 넘어가는 면발은 후각과 미각은 물론이고 청각과 촉각까지 자극해 가슴까지 따듯하게 만든다.
글/신수진
국수의 유래는 먼 고대로 올라간다.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동쪽인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국수로, 서쪽인 유럽은 빵으로 전파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밀로 만든 음식이 한ㆍ중ㆍ일 등 동북아시아 3국에 퍼진 것은 기원전 200년께 중국대륙에서 밀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밀에서 얻은 가루를 면(緬)이라 불렀다.
 |
국수야, 면이야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면보다는 국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로 뽑아낸 면을 물에 담갔다가 손으로 건진다'하여 국수라고 하기도 하고 '밀가루인 면을 국물에 담궈서 먹는다'고 국수라 부른다는 말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국수를 먹었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국수가 문헌을 통해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고려시대 송나라 사신이 쓴 여행기 일종인 '고려도경'을 통해서다. 고려도경에는 "(고려인들은)제례에 면을 쓰고 사원에서 면을 만들어 판다"고 기록하고 있다. 문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국수는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생일, 혼례, 기타 손님 접대용 별미식으로 인정을 받았다.
北은 냉면, 南은 칼국수
 |
특히 함흥지역은 예로부터 국수가 맛있기로 유명했다. 이 지역에서 많이 나는 메밀가루를 주재료로 생선회를 넣어 비빔국수 형태로 만들어 먹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계승돼 함흥냉면이라는 고유명사로 식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꿩 삶은 국물에 굵은 면발이 특징인 평양냉면은 함흥냉면과는 또 다른 맛으로 사랑을 받았다.
우리나라 대표 면요리인 칼국수만큼 지방색이 물씬 풍기는 음식도 없다. 농촌지역에서는 닭 육수에 애호박과 감자 등을 넣어 만들고, 산간지방에서는 멸치장국, 해안지방에서는 바지락장국으로 끓인다.
생면은 숙성시켜야 제 맛
이처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우리 생활 속에 깊이 파고든 면요리. 그러나 의외로 면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든 면은 바로 뽑아 먹어야 제 맛이다'라는 오해다.
냉면과 메밀은 바로 뽑는 것이 좋지만 우동이나 소면 같은 생면은 대부분 숙성시켜야 쫄깃하고 맛이 있다. 또 면요리는 염분이 많아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면을 삶는 과정에서 면에 함유된 염분이 물로 빠져나가 소금 함량은 극히 적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세계의 면요리
세계의 면요리를 말할 때 중국의 중화면, 일본의 라면 우동 소바, 이탈리아의 파스타, 베트남과 태국의 쌀 국수를 꼽는다. 이런 국수를 가지고 각 지방에서 많이 나는 식재료를 섞어 먹어 왔던 것이 오늘날의 다양한 면요리들이라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다시 양쯔강을 중심으로 북쪽은 밀 국수, 남쪽은 쌀 국수가 발달했다.
 |
일본 면 문화는 지역별로 특색이 있다. 관동지방은 소바가 유명하고 관서지방은 우동으로 유명하다. 우동의 국물은 국간장으로 간을 해서 시원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우동으로 제일 유명한 가가와현의 사누키 지방에서 만든 우동이 사누키 우동이다. 1200년 전 홍법대사가 중국으로부터 전통적인 수타제면 방식을 들여와 만들었다고 한다.
이탈리아의 모든 면을 스파게티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면을 '파스타'라 부르며 스파게티는 파스타의 여러 종류 중 하나이다. 파스타는 모양이나 들어간 재료에 따라서 150여 개 종류에 그 형태만도 600여 가지나 된다. 특히 이탈리아에는 파스타 전문 디자이너까지 있어 파스타의 모양, 파스타에 소스가 묻는 정도, 입 안에서의 감촉, 소스의 어울림 정도를 고려해서 매년 수많은 파스타가 디자인된다.
[저작권자ⓒ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