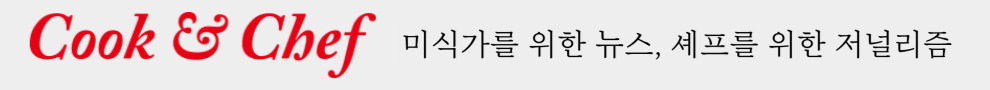40년 역사를 가진 포도명가가 빚은 와인은 뭔가 달라도 다를 것이다. 당연히 좋은 원료가 전제조건이기에 그동안 축적한 고품질 포도재배기술과 양조용 포도에 준하는 당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았고, 지금도 어려움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에 대해 박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주류를 만들다보니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습니다. 판매, 홍보, 유통 모든 것이 제한의 연속이었죠. 거기에 개인회사다 보니 자금난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광명동굴 입점과 단골고객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매달 고정적 수입원이 생기면서 자금난은 조금씩 해소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산 와인이 존재하는 것조차 모르는 이들이 많다. 박 대표에 따르면 한국와인의 시작은 1967년부터였다고 한다. 그러다 1974년 마주앙이 출시되면서 한국와인의 붐이 시작되었는데, 1990년대 초 수입자유화가 시행되면서 한국와인산업은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었다. 그의 표현을 빌자면 그 때부터 지금까지를 한국와인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른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 주요 포도산지에서 대기업 주도의 와인생산이 아닌 소규모 농가형 와이너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150여 개 와이너리가 한국와인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와인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때문에 월류원과 같은 업체들의 힘겨운 노력들이 빛을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그동안 외면하던 전문가들이 조금씩 한국와인을 이해하고 한국와인을 프랑스나 이탈리아와인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한국와인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한국와인의 새로운 발전모습에 감탄과 찬사를 보내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2016년을 시작으로 한국와인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특징 없는 한국와인이 아닌 맛있는 한국와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한국와인은 역경 속에서 살아남았고, 이제 소비자 곁으로 다가가는 중이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박 대표는 한국와인의 르네상스 시대가 머지않은 미래에 열릴 것이라 믿는다.

“그랑티그르는 프랑스어로 번역하면 큰호랑이입니다. 충북 영동군 황간면소재 반야사 대웅전 뒤편에 산신각이라는 산신을 모신 곳이 있는데, 이 산신이 바로 호랑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런 황간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그랑티그르라는 이름을 지었지요.”
물론 이름이 특이해서 최 대표가 자부심을 갖는 건 아니다. 이 와인은 출시와 동시에 출품하는 품평회마다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특히, 월류원의 특허기술을 이용해 만든 ‘그랑티그르 S1974’는 ‘대전아시아와인트로피’에서 처녀출전임에도 은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랑티그르 M1988’은 와인전문가가 뽑은 한국와인 3종에 그 이름을 올리며 새간의 주목을 받았을 정도로 맛이 좋다.
한국와인의 역사는 50년이다. 하지만 사실상 20년도 안 되는 아주 빈약한 존재로 취급받는 게 현실이다. 최 대표는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다. 수입 와인이 손쉽게 소비되는 지금, 넘어서야 할 산이 높은 현실을 돌파하는 것도 벅찬 작업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한국와인을 단순한 국내용에 머물지 않도록 하겠다는 야심찬 꿈을 꾼다.
“한국와인을 만드는 모든 이들의 꿈은 같습니다. 언젠가는 세계 최고의 와인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꿈은 꿈꾸는 자의 것 아닌가요?”
최 대표는 그 꿈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먼저 와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국와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소비자가 외면한다면 한국와인은 또 다시 잃어버린 30년 속으로 숨어버릴지도 모른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가까운 미래에 세계최고의 와인이 우리나라에서 탄생할 것”이라며 최 대표는 자신감을 보였다. 최 대표처럼 한국와인이 가야 할 길을 개척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꿈은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저작권자ⓒ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