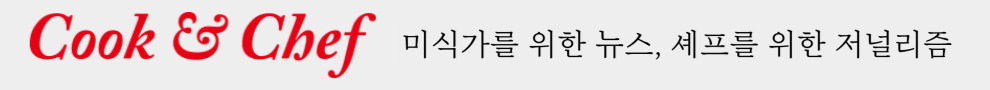[Cook&Chef = 서현민 기자] 국내 천일염에는 다양한 입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 입자들은 아직 각자의 이름과 역할을 갖지 못했다.

국내 천일염 시장에 브랜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 이름을 내건 천일염, 전통 방식을 강조한 소금, 숙성을 거쳤다고 설명하는 제품들은 이미 유통되고 있다. 일부는 백화점 식품관과 온라인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국내 소금은 여전히 ‘저렴한 원재료’라는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인식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니다. 프랑스 게랑드 소금이나 영국 말돈 소금처럼 해외 브랜드 소금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며, 고급 소금의 기준이 함께 수입된 결과에 가깝다. 이들 소금은 단순히 소금이 아니라, 전통과 지역성, 셰프의 사용 사례, 명확한 용도를 함께 제시하며 소비자에게 각인됐다. 그 과정에서 해외 소금은 ‘고급’, 국내 소금은 ‘일상용’이라는 구도가 굳어졌다.
문제는 국내 소금의 품질이 아니라 구조다. 국내 소금 브랜드 대부분은 소규모 생산과 유통에 머물러 있다. 생산자는 존재하지만, 이를 하나의 식문화 언어로 확장시킬 마케팅과 브랜딩은 제한적이다. 소비자는 국내 천일염의 차이를 배울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고, 소금은 여전히 “다 비슷한 것”으로 인식된다.
백화점 식품관의 소금 진열대만 봐도 이 차이는 분명하다. 해외 소금은 산지와 결정 형태, 쓰임이 비교적 명확히 설명돼 있는 반면, 국내 소금은 산지명이 강조되거나 ‘천일염’이라는 큰 범주 안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선택의 기준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인식이 바뀌기란 쉽지 않다.
그 결과 국내 천일염은 스스로 경쟁해야 할 대상이 해외 소금이 아니라 ‘가격’이 되어버렸다. 싸고 많은 소금, 김치와 장을 위한 소금이라는 인식은 시장을 지탱해 왔지만, 동시에 프리미엄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앞선 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 천일염은 하나의 소금이 아니다. 산지와 생산 시기, 갯벌 환경, 입자 크기에 따라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 이미 존재하는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국내 천일염 역시 조리용·마무리용·발효용으로 나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새로운 소금이 아니라, 기존 소금을 이해시키는 언어다.
브랜드화란 포장이나 가격 인상이 아니다. 브랜드는 선택 기준을 만드는 일이다. 이 소금은 언제 쓰는지, 왜 이 입자가 필요한지, 어떤 요리에 적합한지를 설명할 수 있을 때, 소금은 원재료를 넘어 하나의 식문화가 된다.
프랑스 게랑드와 영국 말돈 소금이 만들어낸 인식은 품질의 차이라기보다 설명의 차이에 가깝다. 국내 천일염이 저평가돼 온 이유 역시 그 반대편에 있다. 존재하지만 말해지지 않았고, 만들어졌지만 설명되지 않았다.
이 연재는 국내 천일염을 찬양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 식재료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국내 천일염이 다시 평가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비교가 아니라 이해다. 그리고 그 이해는 지금부터 새로 만들어질 수 있다.Cook&Chef / 서현민 기자 cnc02@hnf.or.kr
[저작권자ⓒ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