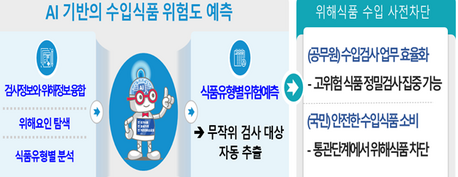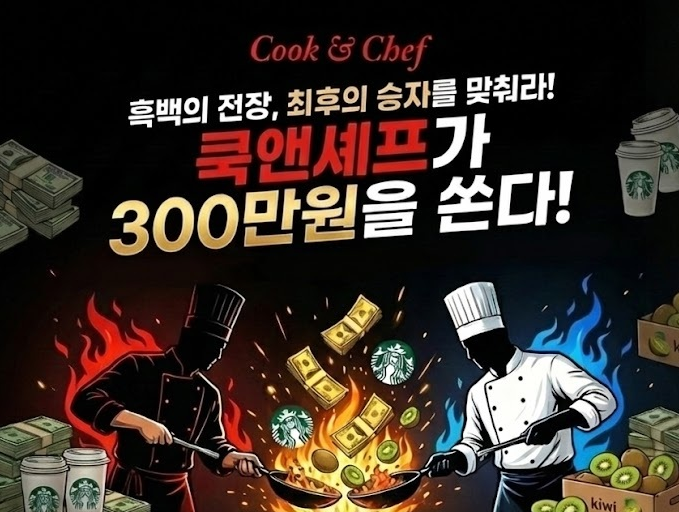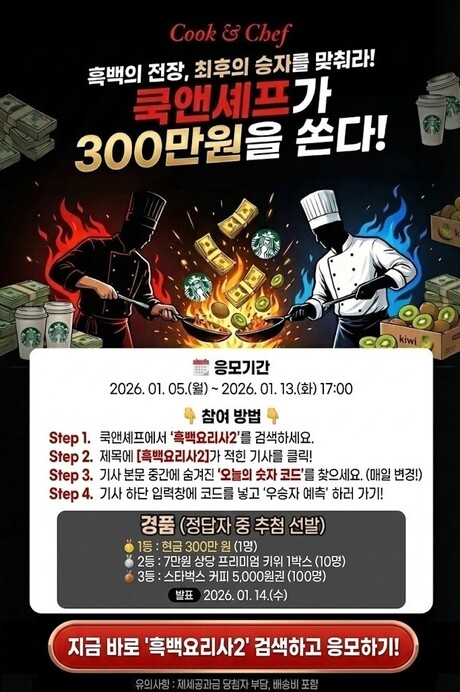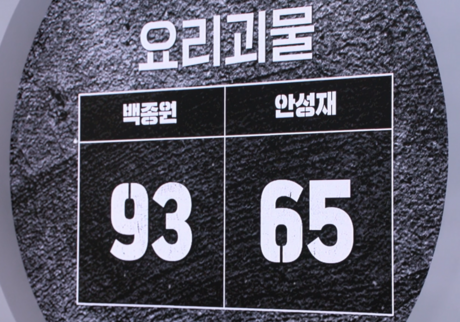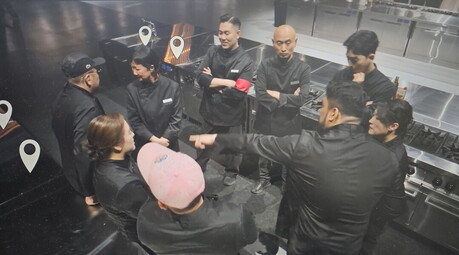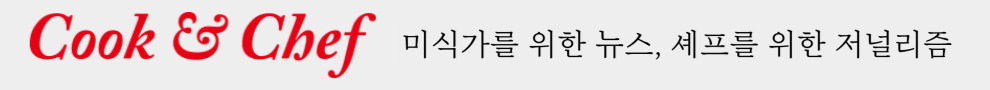영조의 상생 정치와 탕평채
조선 영조가 탕평책을 논하는 자리의 음식상에 탕평채가 처음 등장하였다는 전승은 널리 알려져 있다.
영조는 배다른 형 경종의 죽음 이후 정국의 불신과 붕당 갈등 속에서 아들 사도세자의 비극까지 겪었다. 이후 붕당의 대립을 없애고 상생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당파가 아닌 인물 중심 등용 의지를 담아 ‘탕평책’을 국정 원칙으로 삼았다.
‘탕평’은 중국의 고전 『서경』, 즉 『상서』 홍범조의 “무편무당 왕도탕탕 무당무편 왕도평평(無偏無黨 王道蕩蕩 無黨無偏 王道平平)”에서 유래한 말로, 치우침이 없을 때 나라의 정치가 크고 평평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탕평채는 서로 다른 재료가 조화롭게 섞여 하나의 맛을 이루는 점이 정치적 은유와 맞닿아 궁중 연회상과 손님맞이 상차림에서 조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색의 조화를 이루는 탕평채, 색에 담긴 의미
탕평채는 청포묵에 고기볶음, 미나리, 김 등을 섞어 만든 묵무침이다. 담백한 흰 묵을 중심에 두고 붉은 고기, 푸른 미나리, 검은 김이 대비를 이루면서도 서로 다른 재료가 어울려 하나의 맛을 내는 ‘조화’의 상징으로 읽혔다. 이 섞임의 미학이 바로 탕평의 뜻과 통한다.
선조 임금 때 조선 정계는 동·서인으로 나뉘었고, 이후 동인은 남·북인으로, 서인은 노·소론으로 갈라지며 이른바 사색당파 구도가 굳었다. 후대의 해석에서는 탕평채의 색과 재료를 사색당파에 빗대어 풀이하기도 한다. 검은색의 김(혹은 석이)은 북인을, 푸른색의 미나리는 동인을, 붉은색의 소고기는 남인을, 그리고 흰색의 청포묵은 서인을 상징하는 설명이다.
당시 서인이 집권하던 시기라서 주재료로 흰색인 청포묵을 사용했다는 해석도 전해지지만, 이는 후대의 상징적 독해로 보는 편이 적절하다.
여기에 노란색의 달걀 지단을 더하면 청·백·적·흑·황의 오방색이 고르게 갖춰진다. 오방색은 음양오행사상의 질서(목·화·토·금·수)와 방위(동·남·중·서·북)를 아우르는 전통 색채관으로, 음식 색채를 통해 균형과 합(合)을 비유하는 데 자주 동원된다. 즉, 탕평채 한 그릇의 색 구성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기울지 않음과 서로의 보완을 시각적으로 설득하는 장치였다.
문헌 속 탕평채
탕평채는 여러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송남잡지』에는 “청포에다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섞어 만든 채를 탕평채라 하는데 이른바 골동채이다.”라고 하여 ‘골동채’(섞어 무친 채)라는 이칭을 전한다.
또 『규곤요람』에는 탕평채를 “녹말묵을 잘게 치고 육회를 잘게 쳐서 차게 하여 볶는다. 미나리는 살짝 데쳐서 헹궈 비비고 마늘과 파를 갖은 고명에 미나리를 썰어 한데 무친다. 식초를 치고 담아 놓고 김을 가루로 비빈 것을 남겼다가 위에다 뿌리고 잣가루와 고춧가루를 뿌린다.”라고 하여 고춧가루가 사용되는 다소 이색적인 조리법이 보인다.
『동국세시기』 ‘3월조’에서는 “녹두포를 만들어 잘게 썰고 돼지고기, 미나리, 김을 섞고 초장(초간장)으로 무쳐서 서늘한 봄날 저녁에 먹을 수 있게 만든 음식을 탕평채라고 한다.”고 하여 쇠고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도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탕평채 만드는 방법
1. 청포묵을 얇고 가늘게 채 썰어 끓는 물에 데친 후 찬물에 헹궈 물기를 뺀다.
2. 소금과 참기름으로 밑간한다.
3. 숙주는 거두절미하고 삶아 물기를 꼭 짠다.
4. 미나리는 소금을 뿌려 살짝 절였다가 헹궈 물기를 꼭 짠 후 살짝 볶는다.
5. 고기는 가늘게 채 썰어 갖은양념을 넣고 섞은 후 볶는다.
6. 달걀은 황백으로 나누어 얇게 지단을 부친 후 가늘게 채 썬다.
7. 김은 구운 후 부숴서 준비한다.
8. 간장, 식초, 설탕, 참기름, 깨소금 등으로 양념을 만든다.
9. 큰 그릇에 담고 모든 재료와 양념장을 넣어 살살 버무린다.
10. 잣, 깨소금 등을 고명으로 올려 마무리한다.
이처럼 갖은 색의 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완성되는 탕평채는, 이름의 유래가 어떠하든 섞임을 통해 평형을 세운다는 메시지로 영조가 표방한 탕평의 이상을 일상의 식탁으로 끌어온 음식으로 후대에게 이어지고 있다.
[저작권자ⓒ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